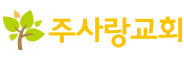말씀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고 박완서 작가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전인 2010년 4월에 하셨던 강연 영상을 봤습니다. 이 강연을 보면서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생명'을 정리하는 글을 썼습니다. 강연과 이 글을 통해 성경이 전하는 생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45분 30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신약성서에는 ‘생명’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셋 있습니다.
프쉬케(ψυχή), 비오스(βίος), 조에(ζωή)입니다.
이 세 단어는 넓은 의미로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각각 생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고유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 프쉬케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없는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처럼 주로 ‘목숨’으로 번역됩니다.
두번째 비오스는 살아있는 상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생의 염려’ (눅8:24)인데 이 '이생'이 바로 '프쉬케'입니다.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살아가는 동안’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세번째 조에는 가장 자주 생명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육체적인 생명을 초월한 상태까지 포함하는 생명입니다. 생물학적인 목숨이나 생활과는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눅12:15)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요6:48) 같은 구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프시케는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는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 조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생명이 가득 부어진 상태를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박완서 작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자신이 사십세 넘어 신앙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은 인기 작가가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많은 집이란 부러움을 받을 때 문득 ‘나한테 누군가가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할 대상을 찾아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각으로 ‘복’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넘치는 복을 받았을 때 자신의 삶을 초월해있는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신)에게 받는 선물이었던 '복'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행복'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신의 선물보다 개인의 성취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넘치는 복을 받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삶에 시련이 닥칩니다. 1988년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얼마 뒤 전문의 과정에 있던 외아들이 교통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을 맞은 겁니다. (후일 박완서 작가는 이때의 경험을 <한말씀만 하소서>라는 자전적인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읽는 참담한 속에서 박완서 작가는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 곡기를 끊고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스스로 고립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살고 싶지 않을 때 맨 처음 위협받는 것이 생물학적인 목숨 ‘프시케’이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일상을 포기하게 되면서 생활인 ‘비오스’도 위협받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잇달아 사별한 충격으로 박완서 작가의 프시케와 비오스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완서 작가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거냐’ 따지며 ‘한말씀만 해달라’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세상의 삶을 보여달라고 매일 매일 신과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인 ‘조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꿈에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프시케’와 ‘비오스’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조에’까지 사라져 버린 상태, 모든 생명이 사라진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죽음의 상태가 뜻하지 않은 일을 계기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비극의 이유를 설명하시고 기적 같은 일로 초월적인 생명을 주셔서 일어난게 아니라 ‘된장국’이라는 가장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음식을 통해서 우연히 옵니다.
절망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수도원에 있던 어느날, 작가는 식당에서 풍겨오는 된장국 냄새에 그걸 먹고 싶어하는 몸의 반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메뉴로 된장국과 밥이 나오자, 허둥거리면서 국에 밥을 말아 맛있게 먹습니다. 이 경험은 한편으로는 처참하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먹은 것이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무 너무 제 자신의 몸에 대해… 의당 내 몸은 남편과 자식을 따라 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것도 안먹고 예쁘게 바스라지듯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아귀같이 내가 먹으니 어째요. 식욕을 거스를 수는 없는거 쟎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프시케, 생물학적인 생명이 꿈틀거린 거지요. 박완서 작가는 자신의 몸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내 몸과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가장 하챦아 보이는 육체적인 생명 ‘프시케’도 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몸에 깃든 생명, 프시케를 통해 자신에게 아직 삶이 남았다는 걸 확인한 작가는 수도원을 떠납니다. 다시 일상, '바이오'의 생명으로 돌아 간겁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만나러 갔을 때 ‘밥이 되어라’ 라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글을 봅니다. 이때 작가는 ‘하나님은 밥’이라고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이 밥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계셨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밥을 통해 생명을 발견한 작가는 자신도 밥이 되는 삶을 결심하고 그후 이 결심은 상처입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작품들로 나타납니다.
박완서 작가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 '조에'는 초월의 상태,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깃든 생명조차 하나님께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긍정하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밥으로 주는 삶을 통해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 분을 통해 얻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참생명입니다.